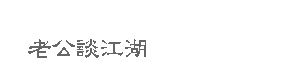노공 삼십육계 서곡 序曲
老公 삼십육계 2014. 5. 16. 16:49 |
사그라지는 화톳불을 쳐다보며 꾸부정하게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보게, 월산(月山)! 자네로 인해 우리 왕현정가(王見鄭家)가 어려움에 처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자네를 믿고 쓴 내 허물인 셈이야. 그러니 더는 상관치 말고 그냥 자네 갈 길이나 가게.”
“가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따라야지요. 허나 일이 이리 된 것은 제가 운이 없어서이지 저의 재주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허, 끝까지 잘했다는 말이구만. 흥륭(興隆)과 함께 마정이가(馬鄭二家)로 이름을 날리던 우리 왕현목창(王見木廠)이 어쩌다 남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까지 내몰렸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일전에 연천(漣川)의 둑이 두 번이나 무너진 건 차치하고라도 자네가 남만(南蠻)까지 내려가 무리하게 일을 벌인 탓에 우리 정가(鄭家)가 이처럼 빚더미에 올라섰다는 걸 자네는 정녕 모른다는 겐가?”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마주하고 있던 사내가 손으로 바닥을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주! 그만 하시지요. 내 지금껏 정가를 위해 개처럼 일했건만 눈앞에 놓인 것은 펄펄 끓는 가마솥이로군요. 더 지체하다가는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니 가주 말씀대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월산은 붉으락푸르락한 얼굴로 노인을 매섭게 한 번 노려보고는 서둘러 청운장(淸雲莊)을 나섰다. 홀로 남은 정씨 성의 노인이 이내 긴 한숨을 내쉬며 막대기로 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불씨들이 허공으로 부산스럽게 날아오르다 사라져갔다. 어둠은 이미 사방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덩달아 그의 얼굴을 덮고 있는 검버섯들도 한층 짙어진 듯했다.
월산이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굳이 탈모를 앞당기며 <노공 삼십육계>를 쥐어짤 필요는 없지..
그나저나 저수지는 대체 어디에 꼬불쳐 놓은 건지...